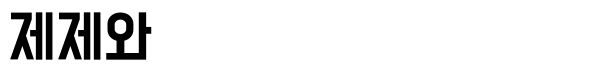삐용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인스타에 올리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삐용이 얼굴만 봐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내가 선택한 사진은 신해님과 갔던 바닷가 소풍 때 사진이었다. 쉼터에서도 늘 웃고 다녔지만, 그때 표정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싶었지만, 티를 내지 않기로 했다.
우리에겐 아직 112마리의 아이들이 남아있고, 그 아이들도 언젠간 별이 될 테니 그때마다 가슴을 치며 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오히려 의연하게 있고 싶었다. 그편이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거의 한 달을 임시 보호하며 모든 것을 다 챙겨주었던 소장님은 계속 우셨다. 소장님은 우셔도 된다. 그래야 삐용이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