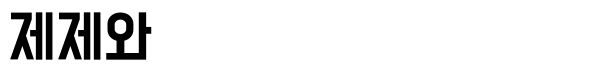우리가 만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소길이가 병원가는 날이다. 소길이는 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설사를 잡고 살을 찌우기 위해 건강한 강아지의 응가를 분말화한 약도 두 달간 먹었고, 요즘은 유산균을 먹이고 있다. 오래도록 관리를 해서인지 응가도 비교적 괜찮아졌고, 살도 쪘다.
응가 캡슐을 먹고, 유산균으로 바꾼지 2주정도 되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소장님은 오후에 제주시내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쉼터에 데려다주고 집에 갈까, 아니면 그냥 늦게 병원에 갔다 집에 데려갈까를 고민하고 계셨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쉼터와 병원은 약 33km다. 병원에서 소장님 댁까지는 약 6km. 위치는 쉼터 - 집 - 병원이다(나는 왜 이런 걸 굳이 따지고 있을까?).
문제는 소장님 댁에 이미 장기 임시보호 중인 강아지가 셋이 있고,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삐용이까지 있으니 넷이다. 거기에 소길이까지 더해지면... 집이 크진 않아서 개 다섯은 그야말로 바글바글이다. 게다가 삐용이도 20kg정도 되고, 소길이도 23kg이다(따지는데 강박관념이 있는듯).
데려가서 하루밤 재우는 건 가능하다치자. 근데 내일 오전 알바가 있으시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서로 친하지도 않은(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음) 개 다섯을 두고 간다? 아, 나는 못한다. 불안해서 손에 일이 안 잡힐 것 같다.

소장님은 소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녁 7시 19분에 병원 결제 승인문자가 왔다. 아이고 결국엔 소길이를 집에 데려가는구나. 애들이 잘 있어줄까 모르겠네.
보통은 병원 진료 후엔 스피커폰을 켜놓고 나, 이사님, 소장님이 통화를 한다. 병원에선 뭐라그랬고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할거고. 그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나눈다. 이걸 굳이 한 단어로 말해본다면 '회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전화가 안 온다. 소길이 데려가서 애들 교통정리(?)하고 샤워도 하고, 식사도 하시는가 싶었다. 또 그 시간이면 우리 반려견 산책시간이기도 해서 '나중에 하지 뭐' 그러고 나갔다 왔다.

저녁 8시 40분. 전화가 안 온다. 이쯤이면 교통정리, 샤워, 식사는 다 했을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의아해하며 내가 걸었다. 운전 중이었다.
"엉? 어디에요?"
"쉼터에서 이제 출발요~"
"소길이 데려다줬어요?"
"네. 뽀식이 저녁 약도 먹일겸요."
"와, 난 저녁에 병원에 가서 소길이 집에 데려가는 줄 알았네."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데려다주려고 왔어요."
소길이 입장에서도 낯선 공간에 있는 것보단(실은 예전에도 한 번 간 적은 있지만) 비록 견사 안이지만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제 공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소장님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쉼터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상은 알바, 그리고 밥 먹고, 똥 싸는 등 기초적인 생활 이외엔 그냥 쉼터 일을 하는 거 같다. 물론 우리도 그러하다. 정해진 시간없이 그냥 한다. 쉼터 일이 어떻게 정해질 수가 있겠는가.
한때는 정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으나 그런게 될리가 없다. 어느정도는 포기했고, 어느정도는 그 속에서 지치지않게 나름의 취미활동을 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집에 가서 소길이 어땠는지 통화해요."
"늦으면 주무셔도 되구요"
"요즘은 10시 넘어서 자니까 괜찮아요(보통은 저녁 9시면 잤다 ㅋ)."
"오, 새나라의 어른이~ 알겠어요~"
우리는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다. 워라밸? 우리는 워크가 곧 라이프고 라이프가 곧 워크다. 꼭 둘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나름의 삶의 방법을 찾고 만족을 느끼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