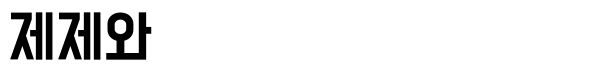어릴 땐 이거가 아니면 저걸 해야했다. 무 자르듯, 딱 나눠서 한쪽으로 올인하는 스타일. 문제는 올인하여 꾸준히 발전시키면 괜찮으련만 잘 안되니까 흐지부지되는 것들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었다. 세상 일이라는게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무 자르듯 나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는 거다.
대부분 이것과 저것의 사이가 가장 많았고, 그 투명도도 제각기 달랐다. 나는 이거와 저거 사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유리한 그 어떤 지점에 머물며 버텨야했다.